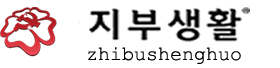어린시절 아빠의 책장에서《벌거벗은 삼국지》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조선족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 일, 한 세 나라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꽤 흥미롭게 쓴 책이였다. 겨우 소학교 5, 6학년 시절에 읽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재미있던지… 아마도 내가 리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시작해서이리라. 이제는 이십년도 훨씬 전에 읽었는데도 일본녀자들은 속옷을 날마다 갈아입으니 다른 나라에 비해 다르다던 한 대목이 생각 날 정도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문화의 차이에 관심이 많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이야기들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 여태 나라간의 문화차이만이 평가의 무대에 설 수 있었다면 이제 산간벽지의 연변도 그 주인공으로 나서게 되였다. 책《박태하와 연변축구 4년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연변축구에 애정을 쏟는 대다수 팬들은 류청 하면 ‘한국의 연변기자’ 하고 바로 눈치 채겠지만 아직 그를 낯설어하는 분들도 많다. 이 책의 저자인 류청 기자는 연변축구 관련 뉴스가 한국에서 더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전해질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또한 연변축구의 슈퍼리그 승격의 현장을 함께 했었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연변땅을 축구라는 리유로 처음 밟아보고 책으로까지 펴낸 사람이다. 책에서 썼듯이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일로 열리기도 한다. 30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단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좋아하거나 미워할 일도 없었던” 연변과 그는 ‘박태하’ 감독이라는 다리 하나로 우연히도 이어지게 되였던 것이다.
물론 이 책은 축구이야기다. 4년간 연변축구를 밀착취재하면서 그의 안테나에 접수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큐처럼 담담하게 풀어낸 책이다. 책을 읽노라면 타인의 눈에 비친 연변이 그리고 연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퍽 더 생동하고 재미나게 다가온다.
겨울이면 ‘패딩’이 아닌 ‘솜옷’을 입어야 하는 연변말이며 ‘불맛’이 많이 나는 소고기 같은 양꼬치, 호불호가 갈리는 랭면에 이어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술냄새를 풍겨야 했던 우리의 음주문화…
책은 물론 이런 먹방에만 그친 것은 아니다. 감동도 있다. 2015년 승격을 결정 짓는 갑급리그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박태하 감독님이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거취를 말씀하던 순간, 통역이 한어로 번역을 끝내기도 전에 박수를 치던 기자들,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뒤로 나가 눈물을 훔치던 기자분, 넙죽 절을 올리던 기자분, 집에서 뉴스로 이 소식을 접하고 줄줄 눈물을 흘리던 우리가 생각나 또 한번 눈물을 훔쳐야 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펼쳐졌던 축구라는 동화는 이렇게 타자의 시선에서 한편의 울고 웃는 드라마로 탄생했다. 물론 해피앤딩이였으면 좋으련만 연변축구는 그렇지를 못했다. 자기 관점을 주장하지 않고 끝까지 카메라이기만을 고집했던 류청 기자도 결국 이 동화의 마무리를 이렇게 엮게 된다. “책을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할 줄은 몰랐다”고.

사실 축구가 사라지고 여태 우리의 소중했던 4년을 외면하고 지내왔다. 아름다웠던 순간은 늘 너무나 짧고 대신 감내해야 할 아픔들이 너무 컸다.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너무 허망하게 보내드렸던 최은택 감독님에 비해서 박태하 감독님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 또다시 기적 같은 날들이 찾아올지 기대가 없는 무력함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뿐이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류청 기자는 말한다. “유형의 팀은 사라져도 무형의 자산은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어린시절 아버지 손길 따라 축구를 많이 보았었지만 그 시절의 기록은 그저 경기장 근처의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축구를 보던 사람들의 사진 그 정도이다. 우리는 각자의 어렴풋한 기억의 한가닥을 붙잡고 그 시절의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 애를 써왔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적은 《박태하와 연변축구 4년의 기적》은 연변과 연변사람들에게 사료(史料) 이상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영화는 영화다》라는 영화가 있다. 건달의 삶을 사는 주인공과 그런 건달을 영화로 표현하는 배우, 현실은 피페해도 그것을 영화로 담았을 때는 예술이 된다는 이런 메시지였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이 비유가 타당치는 않겠지만 별 볼일 없던 산간벽지(연변을 ‘穷乡僻壤’이라고 하던 어느 축구해설원의 말씀에서 발취)의 연변과 그 속의 우리 삶도 류청이라는 카메라가 담아 드라마로 포장하는 순간 우리와 우리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예술로 펼쳐지게 되였다. 과거와는 차별화된 긍정적인 이 드라마가 누군가에게는 어린시절 내가 기억했던《벌거벗은 삼국지》처럼 또 다른 재미와 감동으로 남아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