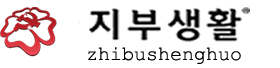#호출
아마 올해 2월초 즈음의 어느 하루였을 것이다.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라는 재난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골도시도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다. 두주일 즉 14일은 버텨야 당신의 도시도 안전하다는 단체문자와, 어느 물류쎈터에서 잠을 자는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마스크에 속만 바질바질 타들어가던 꽤 긴박했던 어느 하루, 누군가의 전화를 받던 남편이 갑자기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려행용 가방을 와락 열더니 무장부시절에 입었던 두꺼운 군용 복장부터 속옷, 양말에 이르기까지 먼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가방에 꾸역꾸역 채워넣는 것이였다.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어딜 가?”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방콕 장기전을 준비하던 나에게 행장을 꾸리는 남편의 움직임은 미쳤다는 말로밖에 형용이 안되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묵묵히 한주일은 족히 입을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개여넣으며 그랬다.
“나 요즘 출근해야 할 거야. 단위서 전화가 왔는데 모두 대기하고 있으래. 가두와 사회구역에서는 음력설부터 뛰여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전 시 공직인원들은 일률로 통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풍차를 타고 다니던 아무개가 확진이라네, 아버지가 어느 병원 의사라 어느 정도 전염되였을지는 알 수도 없네 하는 쉬쉬한 소문이 무성하던 화룡에 남편을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였다. 더구나 화룡-연길 구간을 언제 봉쇄할지도 몰라서 남편은 아예 출근 장기전을 대비해 화룡의 시부모님 집에 눌러있을 타산을 했다. 나는 집 밖을 나서지 않을 계획을 하는데 당신은 집에 오지 않을 준비를 하고, 범의 굴에 가족을 보내는 기분이 있다면 아마 이런 기분일 것이다. 어스름히 불안하게 창문가에 깃들던 그날, 멋모르는 아이는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아빠의 가방 옆에서 강아지처럼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며 즐거워했으나 나는 끝내 웃지를 못했다…
#현장
뚜루룩…
뚝-
뚜루룩…
뚝-
평소엔 아무리 바빠도 마누라 전화는 꼬박꼬박 챙겨받던 남편이 그날 따라 사정없이 내 전화를 끊어버렸다. 풀이 죽어 애랑 둘이서 집안을 뒹굴거리는 내게 한나절이 지나서야 전화는 다시 걸려왔다. 자기가 관리하는 누군가의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다주느라 바빴다고 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주민구역 대문에서 죽치고 앉아서 ‘감시’ 겸 ‘관리’를 한다고 했다. 점심은 먹었냐고 했더니 동료랑 교대로 근처에서 먹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그러는 남편 목소리가 어딘가 꼬댕꼬댕 말라있어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애같이 해맑게 “너무 춥다.”는 것이였다.
남편네 단위서 맡은 일은 외국에서 돌아온 자가격리인원과 그 소속 주민구역을 관리하는 일이였다. 말이 좋아 관리지 쉽게 설명하면 집에서 꼼짝없이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격리인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다주는 택배아저씨 역할 겸 격리수칙은 잘 지켜지는지, 혹여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모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지켜보는 보안직원 역할이였다.
“더우인(抖音)에서 봤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남편들은 료리사로 변신하고 공무원들은 보안이 됐다던데 당신은 어때?” 하고 놀리는 내 말에 남편은 여전히 애 같은 목소리로 “아, 너무 춥다.” 하며 시허옇게 얼어드는 입김을 전화 너머로 전해왔다.

하긴, 남편은 여름에도 춥다며 슬리퍼에 양말을 받쳐신어야 시름 놓는 특이체질이다. 겨울이 오기 전 첫사람으로 겨울옷을 꺼내입었다가 봄이 다 오도록 겨울옷을 벗지 못하는 유리사람이다. 오죽하면 애마저 아빠 영향으로 조금만 바람이 차겁다 싶으면 옷부터 꺼내입어야 안심하는 ‘보살’일가. 그런 남편이 령하 이십여도를 오르내리는 그 한겨울에 하루종일 밖에서 버티고 있으려니 입만 벌리면 춥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저도 몰래 화룡으로 떠나기 전에 옷장 앞에서 서성거리며 새로 산 양복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남편 모습이 떠오르며 픽 웃음이 나왔다. 직장을 옮기고 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동안 양복들을 줄느런히 옷장에 구입해주었으나 출근 몇달이 되도록 여직 세상구경도 시켜주지 못한 채 아침마다 낡은 운동복차림에 두꺼운 군용외투(军大衣)를 껴입고 대문을 나서는 남편, 그래도 입은 살아서 “화룡은 더 전염두 없구 격리만 잘 지키면 안전할 것 같다. 그래도 날마다 집에 돌아와 서연이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린 복 받은 거다.” 하며 씩 웃던 남편… 아마도 옷장 속에 잠자는 양복들은 올해가 저물도록 제대로 입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불길하게 갈마들던 그날이였다.

#사고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나를 속인 적이 없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은 얼음길이 된 위험한 통근길도, 피로에 찌들어 지쳐보이는 당신 몸도 아니였다. 생뚱 같은 사이길이 발단이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남편이 지키는 주민구역중의 한곳은 밖으로 나가는 문이 정문과 뒤문 두개가 있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는 길도 두갈래인 셈이다. 그런데 제한된 인원으로 이 두개의 문을 모두 지키려니 사람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랑비라는 판단에 뒤문 하나는 쇠줄로 동여매고 정문 하나만 개방하게 되였다. 물론 위험인원들에게도 꼭 정문으로 다녀주십사 부탁도 드렸다고 한다. 하나 이쪽 사정이야 어떠하든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뒤문이 다니기도 편하고 거리도 가깝고 기어이 그 문으로 다녀야 할 리유가 있었다. 그래서 든든히 묶어뒀던 쇠줄을 몰래 끊고는 지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뒤문으로 자유로이 오간 것이다. 그들에겐 별것 아닌 자유지만 이 사람들에겐 그들의 이동행적을 파악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뒤문은 절대 안됩니다 하고 선전포고를 하고는 열려진 뒤문을 다시 묶어두고 돌아오던 남편이 그만 한겨울 빙판길에 뒤로 벌렁 넘어지며 허리를 다친 거다. 눈앞에 별이 반짝이더니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란다. 그래도 견딜만은 해서 며칠을 불편한 허리를 애고애고 지탱하며 다니다 보니 자기보다 더 심한 부상자도 있더란다. 과거 가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는 급한 임무 때문에 사회구역으로 종종걸음을 치다가 미끌어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다리뼈가 부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당금 수술을 받아야 한대서 부랴부랴 병문안을 가보니 일에 시달림을 받은 그 얼굴이 말이 아니더란다. 그날 그 동료의 권유하에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남편도 허리부상을 확진받고 이튿날부터 치료를 받아야 했다…
물론 남편은 기층에서 일하는 일개 평범한 공직인원일 뿐이고 그가 했던 일들이 헌신이나 희생과 같은 고상한 단어들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사태가 안정되지 않았던 위험천만한 상황에 한 가정의 가장을 내보내고 홀로 마음을 조이던 안해로서, 아직도 생사를 오가는 초연 없는 전쟁터에 자신의 남편과 안해와 아들과 딸을 보낸 그 이름 모를 누군가가 떠올라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뿐이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우리를 대신해서 위험을 막아주는 든든한 그 누군가의 덕분이라는 말을 봤다. 사회공동체는 언제나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다함없는 책임감으로 수호되는 법이다. 그 보살핌 속에서 내 아이와, 내 부모님과, 내 안해들이 발편잠을 자고 정상적인 일상을 누리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니 하루하루의 보통나날들에 몰부어진 수천수만 무명영웅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우리가 어찌 허투루 잊을 수 있을가?
오늘도 우리의 현재를 지켜주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며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순간을 보내고 있을 이 사회의 모든 영웅들에게 삼가 경의를 드리고 싶다.
연길백화컵(延百杯) ‘전염병 예방통제중의 우리 이야기’ 응모 작품
(필자는 연변교육출판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