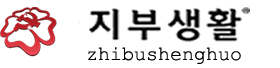‘사회적 거리두기’가 장안의 화제인 요즘이다.
마스크 뒤에 숨은 채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눈살을 찌프리게 되는 광경을 보느니 차라리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서 가족들과 부대끼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도대체 인류에게, 적어도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했을가라는 조금은 철학적인 생각에 잠겨보게 되였다.
바이러스 류행 초기, 처음으로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이 중간에 예고도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은 나에게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가르치고 있었다.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확진자수, 전력으로 환자를 구하다 끝내 삶의 문턱을 넘어버린 의료진… 남의 일 같지 않은 사건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다는 것과 그동안 팽이 돌 듯 바삐 돌아치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지를 직시하게 되였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더 잘 꾸려나갈 수 있을가?’라는 고민이 시작됐다. 그 고민의 끝에는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돈을 좇거나 명성을 떨치는 일이 아닌 이 랭랭한 악플의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을 키워나가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었던 건 어쩜 ‘우리 집’으로, ‘나’로 다시 돌아가 가족의 뉴대를 튼튼히 하라는 게 아닐가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으로 부모님을 잃은 녀자애의 일기를 본 적이 있다. 전염병 류행 초기였던 당시, 의료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관계로 각기 다른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부모님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일인칭 시각으로 써내려간 글이였는데 오히려 담담했던 그 말투가 더욱 가슴이 저려오게 만들었다.
“엄마, 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갔고 나흘째부터는 반찬을 배달해도 아예 드시지 못했다. 병실 앞에 쌓여만 가는 도시락들을 볼 때마다 나는 곧 다가올 상실감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억지로 해야만 했고 그 와중에도 서로의 안부만 묻는 두 분을 보면 억장이 무너져내렸다.”

같은 딸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부모님의 마지막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했다. 일기에서 제일 많이 쓰였던 말은 “아버지는 밥을 잘 드시던?”, “네 엄마도 밥을 잘 먹어야 병마와 싸울텐 데…”, “우리 딸은 밥 잘 먹고 다니는 거지?”…와 같은 서로의 밥때를 걱정하는 말들이였는데 필자는 알 수 없는 동질감에 사로잡혔다. 우리 엄마도 내가 방학에 집에 다녀올 때마다,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꼭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에 대해 그렇게 궁금해하신다. 나만 보면 밥소리 밖에 안 나오냐며 엄마한테 덜컥 화를 내던 그때, 그 짧은 식사안부 하나에 깃든 깊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 것 같다. “밥은 먹었는데 오늘 학교 반찬은 너무 별로였어.”라는 투정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 말 한마디에서 내 새끼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잘 보내고 있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는 걸 철부지를 벗어난 뒤에야 간신히 알게 되였다.
일기에서 두번째로 많이 나온 묘사는 딸을 통해 전하는 서로의 평범한 하루였다. 병실 창문으로 내다본 오늘의 날씨는 어땠고 내가 있는 병실 의료진들은 얼마나 바삐 돌아쳤으며 오늘 내 기분은 어떤지… 평소 집에서 나누는 일상 대화라는 점이 일기 속 딸에게도, 나에게도 조금은 슬프게 느껴졌다. 밥을 먹으면서도 설겆이를 하다가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인데 주말부부인 이들은 평소 이것조차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것이다. 주말이 아니라 매일을 가족과 함께 보냈었던 나도 소홀했던 소통의 시간들이다. 시간은 흐른다. 그래서 시간은 기어코 이별을 만들고 그리하여 시간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서로의 몸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걸 시시콜콜 느끼게 해주는 건 우리의 투박한 체온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이다. 숨 가쁘게만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변하기 전에 빨리 그 소중함을 몸소 겪어봐야 한다.
코흘리개 시절부터 할미손에서 자랐지만 정작 한집에서 몸을 부대끼던 그땐 둘이서 단란히 마주앉아 밥을 먹는 일이 적었다. 아침잠이 많아서, 저녁 약속이 잦아서… 그러나 독립을 하고 있는 요즘, 오히려 할머니랑 같이 식사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더욱 쉽게 감염된다는 언론의 보도에 고령의 할머니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주 2~3회씩은 할머니댁에 방문하게 된 것이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으로부터 밥을 드실 때의 표정과 손짓 하나하나를 관찰하다 보니 그동안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무시해왔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였다. 역시 가족들에게 밥상이란 단순히 저가락질만 오고가는 곳이 아니였다는 걸 다시 가슴에 새긴다. 터밭을 가꾸면서 무심하게 던져주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가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삶의 지혜와 할머니 주름보다 더 깊이 패인 삶의 흉터를 엿들을 수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나에게 가져다준 ‘선물’이다.

‘집’이라는 곳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들 모두 밖에서 아니꼽고 슬프고 무섭고 힘겨운 일들에 치이고 난 뒤 집에 돌아와서는 방문과 함께 입을 꾹 닫고 대화를 단절시켜버린다. 내가 밖에서 겪은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는 ‘말을 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가족이 제일 모른다. 하지만 아는 게 뭐 그리 중요할가. 결국 벽을 넘게 만드는 건 시시콜콜 아는 머리가 아니라 손에 손잡고 끝끝내 놓지 않는 가슴인데 말이다. 마음속으로는 나중에 꼭 성공해서 가족들 호강시킨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래일 당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월이라는 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명기시켜주었다. ‘나중에’라는 말 뒤에 붙는 그 어떤 사치한 수식보다도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지금, 그 잔잔한 미소가 제일 값진 것임을 이제야 어렴풋이 알아간다. 가족들을 향한 그 모순된 애증의 감정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어른이 되여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달라지고 있는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사랑이 답인 것이다.
지금 당장 할머니에게 전화 드려야겠다. 오늘 저녁은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졌으니.
(필자는 복단대학 국제정치학부 2018년급 학생)